‘불계공졸과 불각의 시공’전

‘잘됨과 못됨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작품 첫머리에 찍는 인장에 새겼던 여러 글귀 중 하나다. 당장 눈앞에 놓인 글자 하나만 바라보며 붓을 움직이는 깜냥으로는 짐작할 길 없는 경지의 단언이다.
추사의 글과 조각가 김종영(1915∼1982)의 작품을 나란히 선보이는 ‘불계공졸과 불각(不刻)의 시공’전이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김종영은 “추사 글씨의 예술성은 리듬보다 구조의 미에 있다. 내가 그를 폴 세잔에 비교한 것은 그의 글씨를 대할 때 큐비즘(입체파)이 연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스라엘, 이란 때렸다… 美 반대에도 보복 강행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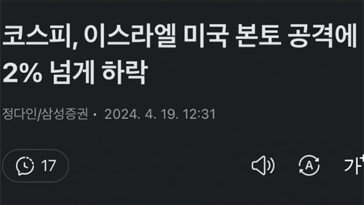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30분만에 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0여년만에 돌아온 ‘석가불 진신사리’ 첫 일반 공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