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맷 타이비 지음·이순희 옮김/544쪽·2만2000원·열린책들
‘돈의 원리’에 따라 얼굴 바꾸는 美 사법 시스템 신랄하게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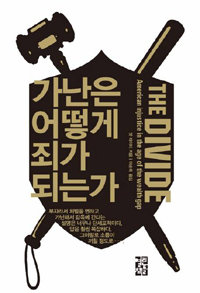
1. 빈곤이 심해진다. 2. 범죄가 감소한다. 3. 수감인구가 늘어난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 빈곤이 심해지면 절도, 강도 등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가. 하지만 이상한 이 논리는 현재의 미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이 책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저자는 ‘돈의 원리’에 따라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됐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렇다고 못 가진 자의 감정적 반발은 아니다. 저널리스트답게 직접 발로 현장을 누비며 경미한 범죄로 감옥에 간 사회적 약자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고액의 변호사 부대로 판결을 뒤집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처럼 대비시킨다.
뉴욕에 사는 노숙자 토리 매런은 시내 공원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힌다. 경찰은 ‘한 번만 봐달라’는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치안문란죄까지 보태 법원에 넘겼다. 저자의 취재 결과 2010년 뉴욕 시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68만4724명 중 88%가 흑인이나 남미계였다. 샌디에이고에서는 ‘P100’이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실제로 어려운지를 검열하기 위해 자유롭게 가택을 수사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속옷까지 검열당하는 멸시를 겪었다고 저자는 밝힌다.
큰 범죄자는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는 반면 가난한 자는 경범죄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왜곡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답은 ‘관료화된 미국 사법부’다. 미국 사법 시스템이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체제의 공정한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관료주의로 썩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들의 핵심 논리가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 에릭 홀더 전 미국 법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만든 개념으로, 미국 법무부가 대형 금융회사를 형사 기소하거나 형사 처분할 때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기소를 아예 포기할 때 쓰는 용어다. 이 기조는 오바마 정부에까지 이어졌다.
“정부조차 대형 기업들과의 법정 싸움을 겁내고 기소를 포기합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향으로 선회하다보니 남는 것은 가난한 약자뿐입니다. 법률적 방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자, 흑인들의 사소한 범죄를 찾아내 업무 실적을 올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증가합니다. 감옥 내 수감인구도 늘어납니다.” 저자의 말이다.
책을 덮으면 미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커진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정의선 현대차 회장, ‘세계 3대 시장’ 인도 직접 챙겼다…“수출허브로 키울 것”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야구방망이에 필로폰 밀수…마약계 ‘큰손’ 미국인, 국내로 강제송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계 최초 ‘입장료’ 받는 도시 생겼다…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