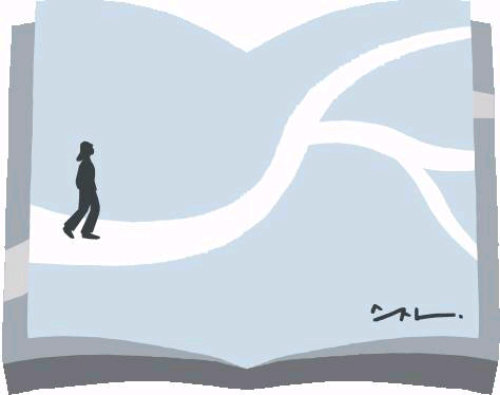
이제 막 보고 나온 영화인데도, 동행과 얘기하다 보면 내가 놓친 장면들이 분명 있다. 책도 그렇다. 이제 막 마지막 책장을 덮었는데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늘 새로운 것들이 있다. 아무리 집중해서 봤다 해도 우리의 기억은 완전할 수 없다. 인간의 기억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몇 달 전, 몇 년 전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볼 때면 ‘내가 정말 이 책을 읽었던가’ 싶을 정도로 생소해 마치 처음 보는 책인 양 다음 장이 궁금해 밤을 새우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큰 줄기와 결론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기에 작가가 초반부터 섬세하게 엮어 놓은 복선들을 발견하는, 처음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었을 또 다른 재미가 생기기도 한다. 또 큰 줄거리 따라가느라 바빠 놓쳤던 소소하지만 주옥같은 장면들이 두 번째 볼 때는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내 나이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야, 책 그만 보고… 그냥 그 사람 만나.” 친구는 주저하고 있었다. 아주 많이 아파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새로운 사랑이 다가와도 어차피 또 식어버릴 사랑, 빤한 사랑, 빤한 아픔, 그래서 주저주저, 친구는 요즘 몇 년 치 책을 몰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나온 길이라고 해서, 네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다. 완벽할 수 없다. 이미 한 번 본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을 온전히 다 알고 있을 순 없다.
누군가를 한 번 만나봤다 한들 우리는 그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말할 수 없고, 스무 살을 이미 겪었다 한들 스무 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순 없다. 그러니 사랑 한 번 해봤다고 사랑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양 떠드는 사람을 누가 과연 믿어줄 수 있을까? 이미 한 번 지나온 길은 그저 한 번 지나온 길일 뿐, 다 겪은 길일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세상엔 없는 것일지 모른다. 빤한 길도, 빤한 사람도, 빤한 사랑도.
강세형 에세이스트
강세형의 기웃기웃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기홍 칼럼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그린스완’ 시대, 숲이 경쟁력이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차로변경 화나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지지율 11%p 떨어져 23%…취임후 최저[갤럽]](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559536.1.thumb.jpg)
[속보]尹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최저치[갤럽]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 B-2 스텔스 폭격기 12대 최대무장·동시출격 훈련 공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세형의 기웃기웃]잃어버린 내 야상](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03/08/61527330.2.jpg)
![[강세형의 기웃기웃]이미 지나온 길](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02/22/61100595.2.jpg)
![[강세형의 기웃기웃]인간의 마음](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4/02/08/60655904.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