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의 모험/윤성훈 지음/352쪽·1만8000원·비아북
한자 22자로 풀어낸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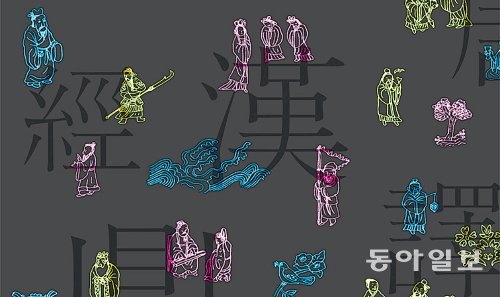
전래동화의 한 자락이지만 교훈은 깊다. 글을 배운다는 건 세상의 이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물며 한문은 한 자 한 자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녔다. 실제로 화담 서경덕(1489∼1546)은 벽에 글자를 붙이고 골똘히 사색한 뒤 다음 글자로 넘어갔단다. 요즘 시절이라면 요령이 부족하다며 질타 받을 일이겠다. 허나 글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진지하다 못해 경이롭다.
한학자 청명 임창순(1914∼1999)이 개창한 태동고전연구소(지곡서당)의 연구원인 저자는 이런 자세가 맘에 들었나 보다. ‘봄 춘(春)’부터 ‘풀이할 역(譯)’까지 한자 22개를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때로는 그 한자의 생김새와 연원을, 때로는 글자에 얽힌 역사와 문화 혹은 신변잡기를 능수능란하게 이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은 ‘한자의 모험’보다 ‘한자의 유랑’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글자 풀이도 재미있지만, 문자에 담긴 역사성도 흥미롭다. 임금 제(帝)가 그렇다. 황제란 칭호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진시황이다. 왕과 제는 천양지차다. “왕이 현실적 권력관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반면, 제는 하늘의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중국을 통일한 그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올라 권력을 누리려 했다.
그런 시황은 중앙권력 강화를 도모하며 ‘한문의 통일’도 주도했다. 당시 한자는 지역마다 중구난방으로 달랐다. 하지만 일사불란한 정부 시스템을 갖추려면 명령을 전달하는 용어가 일관돼야 한다. 결국 진 제국이 글자의 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한자는 “사물과 이어지던 탯줄을 잘리고” 언어의 추상성을 획득하게 됐다.
‘서성(書聖)’이라 불리는 왕희지(307∼365)의 이름 중간에서 따온 ‘복희씨 희(羲)’자로 풀어낸 한중일 한자 삼국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왕희지는 종이에 붓으로 글을 쓰는 후한 시대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킨 핵심 인물이다. 중국에서도 서예는 왕희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한다. 왕희지의 기풍은 한국에선 석봉 한호(1543∼1605), 일본의 오노노 도후(小野道風·894∼966)로 이어져 꽃을 피웠다. 복희는 고대 중국의 시조 중 하나이니, 중국의 한자가 동아시아로 퍼져 각자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씨앗이 됐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참고로 오노노는 빗속에서 개구리의 몸부림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인물. 화투의 비광이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여교사 치마 속 찍은 사회복무요원…고소하자 “죽어서 죄 갚겠다” 위협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준석 “차기 총리로 홍준표 적합…격에 맞는 역할 줘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국무부 부장관 “美, 한미일 협력 유지위해 역할할 것”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