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유복렬 지음/232쪽·1만3000원·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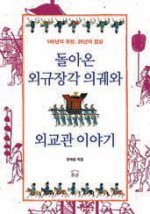
외부에서야 돌아온 보물의 가치에 더 주목했겠지만, 저자에게 의궤는 ‘긴장과 불안의 외줄타기 외교’와 동의어였다. 1999년 4월 처음 열렸던 민간전문가 협상 이래 한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다. 양국 협상단은 처음부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2000년 7월 협상 때는 자크 살루아 프랑스 감사원 최고위원이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후에도 프랑스는 의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문화재를 제공하길 요구했고, 한국은 한국대로 여론에 휘청거리며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과도한 업무로 유산까지 겪었다. 오죽했으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의궤 문제라면 지긋지긋해 신물이 난다”고까지 말했을까.
현재 미국 애틀랜타 부총영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여전히 외교무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이제 이 책을 통해 의궤를 둘러싼 너무나 길고 혼신을 다했던 줄다리기의 줄을 그만 놓고 싶다는 심정을 조심스레 피력한다.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기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본 샹스(Bonne chance·행운을 빕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인문사회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화영측 “술 안먹어” 번복… 민주, 대책단에 대장동 변호 5인 투입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간신히 되살아난 ‘죽음의 늪’, 이번엔 ‘진짜 성공’ 가능할까[황재성의 황금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569660.1.thumb.jpg)
간신히 되살아난 ‘죽음의 늪’, 이번엔 ‘진짜 성공’ 가능할까[황재성의 황금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선홍호 조기 8강 진출 확정…일본, UAE에 2-0 완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책의 향기]오랜 헌신이 고통으로… 가족 간병 사회의 비극](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52.1.jpg)
![[책의 향기]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결심했다, 용서하기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27.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