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1층에 새로 만들어진 기사송고실이 텅 비어 있다. 기자들은 정부의 기사송고실 통폐합 조치에 항의해 새 기사송고실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사례 1 : 200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회의를 열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 회의에 회원사를 대표해 조선일보 판매국 직원 1명을 참석시키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다른 신문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신문협회는 다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2곳을 회원사 대표로 뽑았지만 공정위는 이마저도 거부해 결국 협회는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그동안 메이저 언론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해 온 단체들은 이날 회의에 대거 초청받았다.
사례 2 : 지난해 9월 영남지역에 있는 한 동아일보 독자센터(지국). 공정위 조사원이 독자센터 운영 현황과 독자 명단을 모두 내놓으라고 했다.
느닷없는 자료 요구에 놀란 독자센터장이 이유를 묻자 조사원은 “신문을 구독하는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뒤지던 조사원은 푸념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 지역에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팀만 3개예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 없어질 일인데. 참….”
한 달 뒤 호남지역의 한 독자센터에 조사를 나온 공정위 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노린) ‘신문 파파라치’가 200건을 한꺼번에 신고해 조사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불법 경품과 무가지(無價紙) 제공을 근절하겠다며 2005년 4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신문이라는 특정 업종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다른 업종에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여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조사는 동아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몇몇 신문사에 집중돼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양대 이민웅(신문방송학) 교수는 “김대중 정권 때만 해도 기존 제도의 틀 아래서 행정적 통제로 비판 언론을 압박했으나 현 정권은 △신문고시(告示) 개정, 위헌(違憲)적인 신문법 제정 등 법률적 통제 △언론사 간 광고 차별 집행 등 경제적 통제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의 칼이 된 ‘신문고시’
노무현 정부 출범 뒤 공정위가 가장 먼저 서두른 작업은 신문고시 개정.
2003년 3월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뒤 신문고시는 공정위의 뜻대로 바뀌었다.
신문고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1999년 폐지됐다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중에 부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문업계의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김대중 정권 때도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초점은 부당내부거래로 동아일보에 62억 원,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관련사에 34억 원, 중앙일보 및 중앙일보 관련사에는 2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권이 바뀐 뒤 과징금을 철회했다. 동아일보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 부당내부거래 혐의로는 법원에서 이길 승산이 없으며 과징금 부과 역시 무리한 조치였다는 것을 공정위가 자인한 셈이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바꾼 것은 비판 언론을 좀 더 치밀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부당내부거래는 주로 신문사 내부 문제에 한정된 반면 불공정 거래행위는 신문지국과 독자(소비자)로까지 규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신문고시는 신문지국은 물론 본사까지 옥죄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이 ‘타깃’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3월 공정위가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개 메이저 신문사에만 모두 5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이 조사는 친(親)정권 언론단체로 꼽히는 민언련 등의 신고에 따라 진행됐다. 이들은 유료신문 발행 부수를 파악하는 기구인 한국ABC협회의 2002년도 발표를 근거로 2003년 말에 신고했다. 당시 ABC협회에 유료신문 부수를 자진 신고한 신문사는 동아와 조선, 중앙일보 등 3개사뿐이었다.
이에 대해 ABC협회를 포함한 언론 관련 4개 단체는 권오승 공정위원장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무가지 제공은 신문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인데도 3개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하게 부수를 신고한 신문사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2005년 4월에는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가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동아, 조선일보 독자에게 경품을 받았는지를 묻는 조사용지를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무상 취득한 신문지국의 독자정보를 가지고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자에게까지 조사용지를 보낸 행위는 표적조사인 동시에 과잉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의도를 가진 압박
공정위의 언론 관련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은 2004년 8월부터 집중 제기됐다. 공정위에서 신문고시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무관이 55쪽 분량의 신문 관련 문건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넘긴 사실이 공개된 것.
문건에는 각 신문의 논조 분석, 언론개혁 방향 등 공정위 업무와 무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 ‘신(新)언론공작’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사무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 신문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한다며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정부 부처가 시민단체가 할 법한 ‘여론몰이’식 캠페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업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서명운동을 캠페인에서 제외했다.
정권 말 공정위의 언론정책 방향은 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권 위원장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인 보도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는 악의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07년부터는 순진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광화문에서/하정민]러스트벨트 ‘미사일맨’ 귀환… 한국은 맞을 준비 돼 있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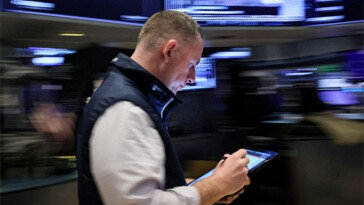
기술주 투매 현상 발생, 美증시 정점 찍었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이들 보고 있는데…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