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자면, 22일 개봉하는 영화 ‘두 사람이다’는 원작과 아주 다르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 죽는 설정을 빼 놓곤. 다르다는 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원작에 의해 형성된 기대를 저버렸다는 데 있다.
여고생 가인(윤진서·사진)은 첫째 고모가 둘째 고모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엄마와 친한 친구 등이 계속 가인을 죽이려 한다. 이상한 남학생 석민(박기웅)은 가인에게 계속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는데 가인은 곧 집안의 저주에 대해 알게 된다.
원작에선 승천 직전 이무기가 품은 원한이 집안에 화를 불러오며 누가 그 ‘두 사람’인가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의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 피가 안 나와도 서늘한 공포가 있다. 그러나 영화는 사람을 수십 번 찔러대며 피 칠갑을 하면서도 그저 ‘헉’ 놀라게만 한다.
심리극은 사라지고 ‘슬래셔(slasher)’만 남았다. 칼 들고 달려드는 장면이 반복되니 나중에는 살인 게임 같다. 집안의 저주는 처음에 좀 나오다가 나중에는 살면서 한두 번쯤 느낄 만한 순간적인 살의(殺意)를 통해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그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집안의 저주는 어떻게 된 건지….
느닷없이 나타나(그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하는 박기웅의 모습은 전혀 무섭지 않고, 미안하지만 자꾸 웃음이 나온다. 배우가 아니라 영화 속 그의 캐릭터에 원인이 있다. 다른 배우들도 그렇다.
원작 만화의 제목은 ‘주인공을 죽이려는 사람과 그 조력자’라는 뜻. 그러나 이 영화의 제목은 왜 ‘두 사람이다’일까. 누구를 말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다가도 결말을 생각하면 또 아니고. 하여간 찝찝하다. 18세 이상.
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자산 325조’ LVMH 회장, 자녀 승계작업 속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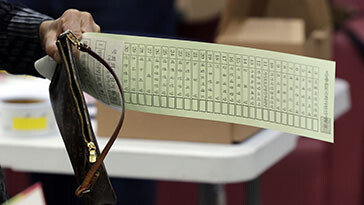
보조금 28억씩 챙긴뒤 사라지는 여야 위성정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MF “韓 성장률 2.3% 유지… 美는 0.6%P 오른 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