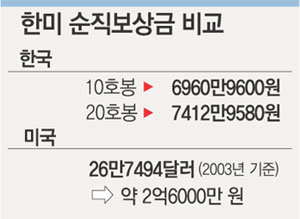
경기 안산소방서 119구조대 김근태(34) 소방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1년 10개월 전 자욱한 연기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동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2004년 4월 12일 오전 1시 23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신고가 들어왔다. 사동소방파출소와 인근 상록수소방파출소에서 각각 5명씩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6명은 운전요원, 2명은 구급요원이었다. 진압요원은 어수봉(당시 40세) 소방교와 김 소방교 단 2명뿐이었다. 20여 분간 사투를 벌여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어 소방교는 곧바로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이웃집으로 뛰어들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김 소방교는 잔불 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았다.
진압요원은 2인 1조로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장에선 이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1시간 뒤 어 소방교는 뒤늦게 출동한 다른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난 집의 맞은편 집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방교는 “유독가스가 꽉 찬 상태에선 한 번만 연기를 들이마셔도 정신을 잃는다”며 “어 소방교가 식탁에 걸려 넘어지면서 산소마스크가 벗겨졌다. 옆에서 누가 보조마스크만 바로 씌워줬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어 소방교처럼 산화한 소방관은 2000년 이후 18명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농협 직원, 고객 펀드서 2억 원 횡령”…금감원, ‘정기 검사’ 착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금개혁, 여야 이견에 정부는 다수안 반대… 21대 국회 문턱 넘기 힘들듯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리 동네 불나면 얼마후 끌수 있을까[GIS 분석]
우리 동네 불나면 얼마후 끌수 있을까[GIS 분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