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발언이 아니다.
1980년 8월 21일 예편을 하루 앞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전두환(全斗煥) 대장의 부인 이순자(李順子) 씨가 전역식 전야제 행사에서 한 말이다.
신군부의 군홧발이 정치무대를 장악한 1980년의 서울에서는 이런 비정상이 일상적으로 가능했다. 헌법상 대통령과 사실상의 국가원수가 따로 있던 시절이었다.
공군참모총장의 건배 제의도 이랬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차기 국가원수로 전두환 대장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 장군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날인 22일 서부전선 1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전역식은 사실상의 대통령 행사였다.
‘국가수반 경호경비 계획’에 준하는 사전 조치가 취해졌다. 사령부 내 모든 창문이 완전 봉인됐고 주변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역식 동안 모든 군사훈련이 중지됐으며 행사 요원을 제외한 사병 전원은 내무반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 장군’을 위한 철저한 사주경계였다고나 할까.
전역식 자체는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단 이상을 호령하는 2성, 3성 장군들도 말석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같은 달 5일 ‘별 넷’을 달았고 그로부터 17일 만에 군복을 벗은 ‘전 장군’은 전역식 5일 뒤인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시 유엔군총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존 위컴 씨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이 전역식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민간인이어야 하므로 그는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면 헌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구독-

오늘과 내일
구독
-

‘그린스완’ 시대, 숲이 경쟁력이다
구독
-

어제의 프로야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尹, 홍준표-권영세 만나 총리인선 고심… 비서실장 정진석 등 물망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의사 등 60명 “구글이 악플 방조” 집단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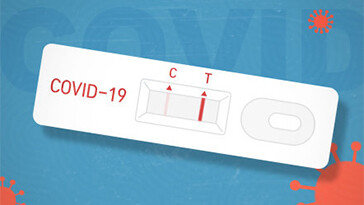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