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법안에 명시된 ‘국어상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굳이 국어까지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피곤해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상담소 같은 역할이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맞춤법과 표준어를 보급하는 기능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 언어가 오로지 맞춤법 교정, 표준어 교육 강화 정도에만 그쳐도 되느냐고 되물어 보면 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두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말은 그냥 내버려둬도 잡초처럼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식물 가운데는 들풀이나 들꽃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정원수나 화초처럼 사람 손이 일일이 가야 하는 것이 많다. 언어에도 통속어처럼 야생적인 말이 있고, 농산물처럼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는 말도 있다.
친구들과 농담할 때는 야생적인 언어를 써야 더 친화력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협의할 때, 학생을 가르칠 때, 남에게 감동을 주고 싶을 때 등은 예외 없이 잘 다듬은 언어를 사용해야만 성과를 맛볼 수 있다.
주변을 보면 글을 쓰거나 읽는 일, 토론 등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돌이켜 보자. 자녀들과 일방적 훈시가 아닌 진지한 대화를 10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아가 학부모로서 교사나 다른 학부모와 자녀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가 하는 등등의 물음에 쉽게 긍정을 할 수가 없다.
좀 더 일상생활의 문제를 살펴보자. 평생 간직할 애송시가 있는가 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깔아 놓고, 수첩에도 끼워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독을 권하는 시 한 수 말이다. 아니면 좋은 연설문의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 둔 것이라도 있는가, 두고두고 인용하고 싶은 신문 사설의 탁월한 비유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자성어 몇 구절로 근근이 삶의 메마른 부위를 대충 쓰다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물음을 던져 봐야 한다.
앞으로 국어상담소가 세워지면 넓은 의미의 이런 삶의 문제를 한 번 성찰할 기회가 올 것이다. 물론 맞춤법 문제나 표준어 문제도 다룰 것이다. 그러나 국어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요즘 세태에 적어도 한 번쯤 읽어야 할 글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권할 만한 책은 무엇인지, 자녀가 유난히 글 읽기를 싫어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하는 ‘교양’과 ‘교육’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지냈지만 이제는 어떤 책의 저자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져 보고 내가 쓴 기행문을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도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물론 이를 위해 내딛는 첫 단계는 소박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온 국민의 문화 수준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고 전문가도 부족하다. 일제 시대 때 브나로드 운동에 허점이 많았음에도 맨손으로 일반 대중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지 않았는가. 국어상담소가 국민의 지적 수준과 문화의 관심도를 더 높여 스포츠나 영화에 대한 열기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살지게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의 관심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하수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연세대 교수
문화 칼럼
구독-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

황재성의 황금알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앞차는 수배범, 뒤차는 만취…황당한 교통사고 나란히 재판행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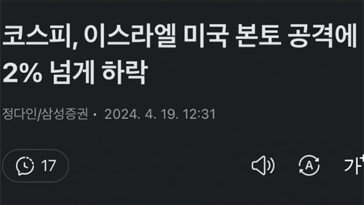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30분만에 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선홍호 조기 8강 진출 확정…일본, UAE에 2-0 완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화칼럼/정이현]한국소설이 재미없다고요?](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05/08/09/6951613.1.jpg)
![[문화칼럼]김하수/언어는 들꽃이 아니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