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박성재(朴晟在·24)씨. 윤득헌(尹得憲)체육부장 한진수(韓進洙)문화부장과 마주앉았다. 앳된 모습의 박씨 앞에 앉은 두 부장은 조금 멋쩍은 표정.
‘스포츠 마니아’라는 박씨는 체육부장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스포츠섹션의 뉴스그래픽 스펙트럼 같은 자잘한 ‘굴뚝박스’ 읽는 재미가 괜찮아요. 하지만 요즘 지면이 줄면서 정보량이 너무 적어진 것 아닌가요? 또 동아일보 스포츠면이 다른 신문과 다른 게 뭔질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죠?”
긴장한 체육부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IMF여파로 감면을 단행한데다 축구 야구 농구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주제를 소화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기사와 정책비판기사, 짤막짤막한 정보성 기사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장 맞받아치는 박씨. “그런데 지난달 30일자는 온통 ‘동아마라톤’으로 가득 찼어요. 농구 포스트시즌이나 코앞에 닥친 축구 한일전에 대해 읽고 싶은 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방적인 질책. 당찬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종합지의 스포츠면은 스포츠신문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면을 밀도있게 사용하면서 체육계의 비리 등 심층취재 기사도 있어야 해요. 3월1일 축구 한일전의 패배 이후 차범근감독 경질설이 오갈때 국민이나 다른 언론의 일희일비(一喜一悲)에 일침을 가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독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참 동생뻘’되는 독자에게 집중포화를 얻어맞은 체육부장. ‘쩝’하고 입맛을 다시는데 질책의 화살이 문화부장에게로 튀었다.
“영화면이 부쩍 늘어난 것은 환영해요. 하지만 줄거리 소개에 지면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요. 온갖 TV프로가 새 영화나 비디오의 ‘예고편’을 틀어주고 있는데 신문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깊이있는 이해를 위한 분석기사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4월1일 지면개편 때부터 영화면에는 별표로 매기는 레이팅(rating)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심층적인 기획들도 발굴하고 있구요.”
서둘러 대답하는 문화부장.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다.
“책이나 공연, 전시회를 소개하는 지면은 ‘백화점식’입니다. 책 한권, 연극 하나라도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소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독자들의 취사선택에 도움이 안되는 정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자의 눈으로 걸러낸 책이나 공연을 ‘제대로’소개해줬으면 합니다.”
한대 맞았다는 표정의 문화부장.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도 있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박씨가 단호하게 결론처럼 던지는 한마디.
“신세대는 신문의 ‘객관적’이라는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이지만 개성있는 주장을 해주길 바랍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개성있고 탁월한 시각과 주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모든 신문이 똑같다’는 말을 안듣죠. 대중만 뒤따라가다보면 언젠가는 독자들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정리〓박중현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세금 2억’ 쓴 한강 괴물 조형물, 결국 철거된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잘 먹고 에너지 넘친다”…푸바오 격리 2주 차 근황 공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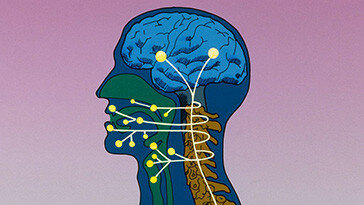
무슨 일 하세요? …“치매 위험 높은 직업 따로 있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