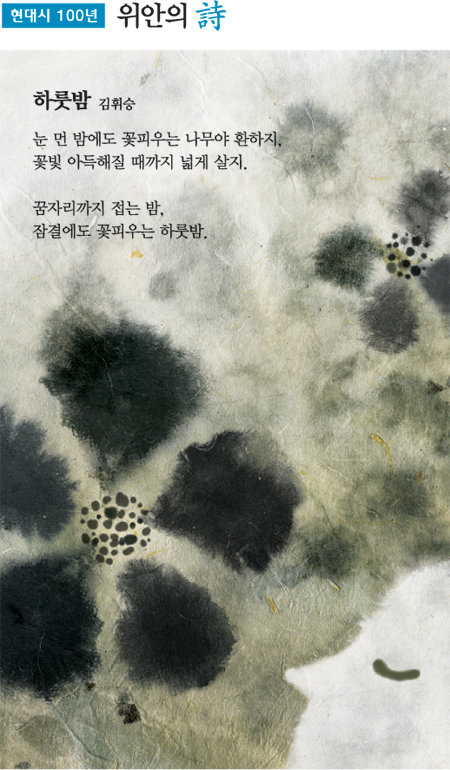
김휘승의 시를 읽다 보면 마치 내가 잘 영근 호두알을 미세한 바늘로 꺼내 먹는 느낌이 든다. 호두의 단단한 겉껍질은 물론 안에서 고소한 알맹이를 나누고 있는 다치기 쉬운 속껍질까지 건드리지 않고 신중을 기해 파먹는 집중력이 저절로 생긴다. 그는 미세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미세하게 읽도록 만든다. 김휘승의 시는 김종삼처럼 자연스럽지도 않고, 김춘수처럼 치밀하지도 않다. 김종삼처럼 자연스럽기에는 상(象)이 너무 많고, 김춘수처럼 치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김휘승의 시에는 김종삼 같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김춘수 같지 않은 치밀함이 서로 반응하며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김휘승은 이 화학작용으로 1990년대 시인들의 과격한 실험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전형적인 서정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행간을 뚫고 발생하는 심상의 복잡함, 유연한 전개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전혀 맥락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은 시의 전범을 파괴하고자 하는 일군의 시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아주 오래 침묵하고 있다.
꽃은 아무도 봐주는 이 없어도 홀로 피고, 홀로 지는 것처럼, 김휘승의 시의 꿈자리는 “꽃피우는 하룻밤”으로 접힌 걸까? 아니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하룻밤에도 그는 어디서 그의 시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꼭 이런 밤, 그리운 시인이다. 그리운 사람이야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함성호 시인
환자곁에서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프리미엄뷰
구독
-

사진기자의 사談진談
구독
-

행복 나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단독]쿠팡,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의혹 공정위 조사 받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권리당원 2배로 늘려야”… 당원도 친명 중심 재편 의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자곁에서]"보채는 게 반가워요"](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