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이 이렇게 불렸던 이유는 다양하다. 복장검사를 빌미로 자꾸 교복 치마 속을 들춰서, 툭하면 ‘이름표가 삐뚤어졌다’며 학생들의 가슴을 만져서, 여름철 ‘속옷은 제대로 갖춰 입은 거냐’며 여학생들의 등을 쓸어내리고 다녀서다.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운다는 명목으로 허릿살을 꼬집거나 귓불을 만지고 속옷 끈 튕기기를 즐기기도 했다. 교복을 입고 두 손을 들면 배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 시간 각종 이유로 교실 뒤에 손들기 벌을 세우고 ‘관람’하는 교사도 있었다. 여성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문제적 교사’의 유형은 실로 다채롭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불거지는 교사 성폭력 사건들을 보고 있노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뻔한 패턴에 놀란다. 엄마, 이모, 언니들이 겪었던 일을 딸, 조카, 동생들이 여전히 겪고 있다. 재작년 서울 S여중 사건부터 최근 경기 H여중고교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된 수십 건의 사건이 모두 그렇다.
민원이라면 질색인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은 최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길 기원하며 사건을 처리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고발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며,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시작된다. 과거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한 학교 교장을 취재했을 때 그는 “중학생은 아빠가 안는 것도 싫을 나이라 민감한 것” “젊은 교사였으면 애들이 먼저 뛰어와 안겼을 텐데”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런 학교를 조사하면 십중팔구 ‘아주 오랫동안 다수의 교사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학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나 매뉴얼 마련을 눈감아 왔다. 하지만 ‘스쿨미투’가 끝없이 터지는 상황에서 이젠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명확한 ‘두낫리스트(Do Not List)’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학내 성폭력은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아주 미묘하게, 훈육과 추행의 경계선을 묘하게 넘나들며 습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뉴스룸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공간의 재발견
구독
-

HBR insight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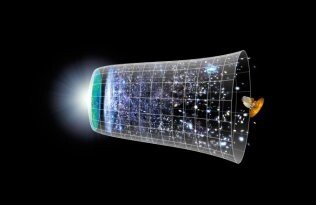
“빅뱅이론 시효 끝나”…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흔들린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속도로 요금소서 일제 ‘음주단속’…2시간 동안 ‘14건’ 적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뉴스룸/박재명]‘연판장 돌리기’로 번지는 공시가격 인상 반대](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9/03/29/94792510.1.jpg)
![[뉴스룸/장관석]‘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청문회](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9/03/28/9477314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