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복지관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회원님’이란 호칭을 쓰는 곳도 있다. 노인 제품에서도 ‘실버’란 단어를 붙이는 건 금물이다.
사실 법적으로 노인(老人)을 정의하는 ‘특정 나이’는 없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은 없다. 26조(경로우대)에 ‘65세 이상은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한다’거나 27조(건강검진)에 ‘65세 이상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정도다. 이후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노인복지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65세’로 굳어졌을 뿐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인 기대수명은 83세다. 38년 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세였다.
노인연령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후 주기적으로 노인연령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매번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논의가 금방 사라졌다.
이유는 찬반 대립이 거셌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미래 세대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가 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일 정도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각종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아갈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탓에 노인연령을 높여 사회 전체의 복지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개편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 측은 ‘고령세대의 빈곤’에 집중한다. 국내 노인빈곤율이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상향하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노인이 대규모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높아지면서 퇴직 후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소득 크레바스(절벽)’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일본처럼 ‘전기(前期) 노인’(65∼74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의료, 복지를 단계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정년을 없애고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다.
‘듣기보다 말하기가 좋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이나 일을 왜 하느냐고 말하곤 한다….’ 미국 의학협회가 정의한 ‘노인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노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나이 듦’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 달렸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
광화문에서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프리미엄뷰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나들이 철 고속도로 음주 단속했더니…2시간 만에 14건 무더기 적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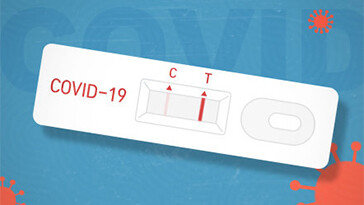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엄마 못봤나요”…경찰로 착각해 달려온 아이에게 美배우가 한 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신나리]여야, 22대 국회서 공약의 최대공약수부터 찾아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8/124551748.2.jpg)
![[광화문에서/황규인]로봇 심판 등장으로 거수기 된 인간 심판](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7/124532494.2.png)
![[광화문에서/최동수]불확실성 커진 부동산 시장… 더 늦기 전 국회가 움직여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6/124512484.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