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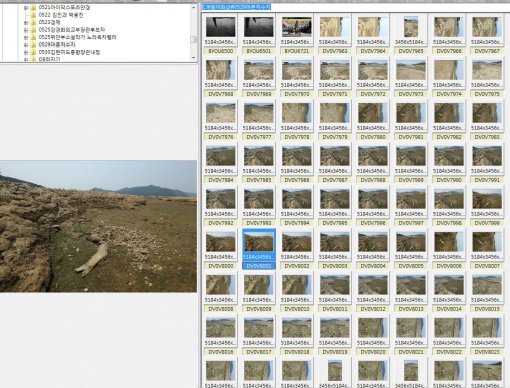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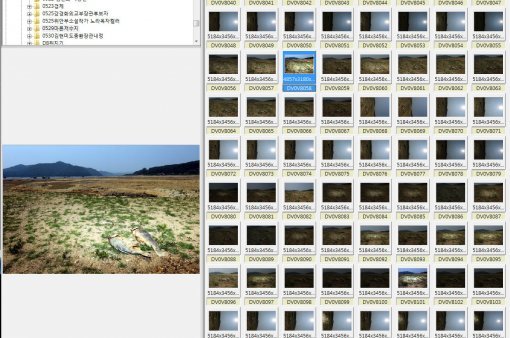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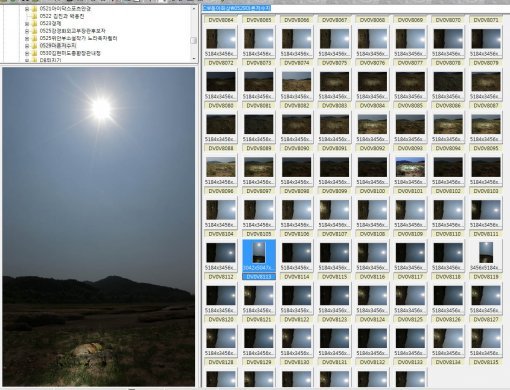


이 사진은 월요일인 29일 오후 1시 40분쯤 찍은 사진이다. 이날 아침 다음 날 신문에 들어갈 사진을 준비하는 회의에서 나온 주제는 “대구는 낮 기온 34도의 폭염과 영농철 맞은 전국 가뭄확산 비상/ 충북 진천 바닥 갈라진 초평저수지, 경기 광주 퇴촌면 우산1리(매내미), 거먹골(영동리) 급수차 지원,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저수지”였다.
오전에 출입처 회의를 마치고 용인 이동저수지로 곧바로 이동했다. 인터넷에 며칠 전 찍은 사진들이 돌고 있어서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처음 본 것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이었다. 가뭄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사진이었다. 전형적이었던 것만큼 기시감이 컸다. 좀 더 저수지 상류로 이동했다. 갈라진 바닥은 보이지 않기 시작했지만 잉어의 사체가 하나 보였다. 별로 ‘그림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저수지 안쪽으로 움직여 보았다. 수초와 잡초 사이에 바짝 말라가고 있는 두 마리 물고기 사체가 나란히 보였다. 가로로 찍어보고 세로로 찍어보았다. 기본은 되는 사진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하지만 조금 욕심이 났다. 강한 태양빛이 머리 위에서 내리 쬐고 있었지만 카메라 플래시를 켰다. 배경을 어둡게 하고 물고기 사체만 도드라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타고 갔던 차 트렁크에서 신문지를 꺼내 바닥에 누워서 찍어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사진은 쉽게 얻어졌다. 그렇게 20분 정도 촬영을 했다. 너무 쉽게 얻은 사진이어서였을까. 사진이 의심을 받았다.
두 마리의 잉어 사체가 풀 위에 놓여 있는 광경은 낯설지만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진기자가 개입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다.
“요즘 그렇게 찍으면 큰 일 납니다”라는 답문자를 넣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거 라는 느낌이었다. 선수들끼리 연출했으면 했다고 하지 굳이 그걸 우리끼리 숨기냐는 느낌 그런 거 였다.
아… 신문사에서 2,30년씩 일하신 분들도 포토저널리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깊은 반성을 해본다. 보도사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보도사진의 신뢰성을 위해 내가 한 일이 과연 뭐였을까 그런 반성이었다.
이 날 찍은 사진은 총 180장 정도 된다. 평소보다 적게 찍었다. 그리고 180장 중 어떤 사진도 사진기자가 피사체에 대해 손이나 발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2마리가 완벽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사진 속 모든 현상을 그것도 인간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이라면 설명할 능력이 없다. 사실 “누가 봐도 연출인 사진”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게 지나친 자의식의 발로일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신문에 실려 독자들에게 전달되기 전 뉴스룸에서 게이트키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현장을 만들거나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만 24시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질문에는 똑같이 답할 수 밖에 없다.
신문사진 대부분이 연출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건이나 중요 이슈에서 연출은 상당한 위험 요소다. 그래서 신문사와 방송사의 에디터들은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가뭄이라고 하는 게 천재지변이면서도 인간이 관리해야하는 영역일수도 있기 때문에 연출은 자제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다.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그런 논쟁과 에너지가 합쳐진 사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오늘도 기록에 충실한 사진기자들의 땀이 나의 사진 때문에 오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쓴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변영욱의 공정한 이미지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시론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출산율, 다시 ‘1.0대’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입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세훈, 서울시의원들에 편지…“TBS 지원연장 간곡히 요청”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도난 불화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前박물관장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영욱의 공정한 이미지]청와대사진기자들이 난동을 부렸다고요?](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7/07/02/85160805.3.jpg)
![[변영욱의 공정한 이미지] ‘연출’ 같은 가뭄 사진, 사실은…](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7/05/30/84638871.3.jpg)
![[변영욱의 공정한 이미지]후보와 악수한 사람은 누굴 찍을까요?](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7/04/26/84085455.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