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CEO)였던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은 생전에 내놓은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에서 “이 사건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지극히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회고했다. 노조에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줘 현대차가 거의 매년 노사분규라는 ‘홍역’을 앓게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최근 사측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월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신차종 개발 시 국내 공장 우선 생산, 단체협약 유효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올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경쟁 자동차 기업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요구안은 무리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업계를 위해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마당에 현대차 노조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 ‘염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요구한 공장 간 일감 나누기’와 ‘혼류(混流)생산(한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만드는 것)’ 등 유연한 생산방식을 받아들인 만큼 노조도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감 나누기와 혼류생산은 노조가 생색을 낼 사안이 아니다. 안 팔리는 물건을 덜 만들고, 잘 팔리는 물건을 더 만드는 유연한 생산 방식은 제조업의 ‘상식’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유연한 생산 방식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재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주장이 ‘떼를 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 생산 차질을 우려한 사측이 ‘일단 막고 보자’는 생각으로 노조에 끌려 다녔기 때문. 이 과정에서 정부도 현대차 조업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과 대량 실업사태 등을 우려해 노조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다.
이달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현대차 임단협에서는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 제고 없이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청와대가 현대차 사측에 전화를 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송진흡 산업부 차장 jinhup@donga.com
메트로 25시
구독-

조영준의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고기+막걸리 먹으러 뛴다”…1만원 금천구 ‘수육런’ 홈피 마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한 영상 녹화실 공개…“작은 유리창 아닌 통창”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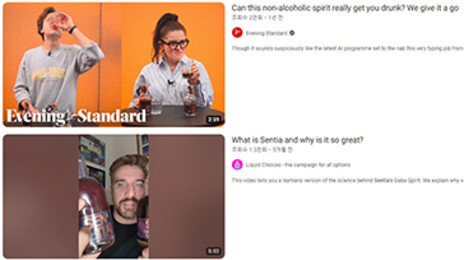
“알코올 없는데 취하는 술” 운전해도 ‘0.000%’…의견 분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메트로 25시]24시간 사우나/직장인의 '원기 충전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