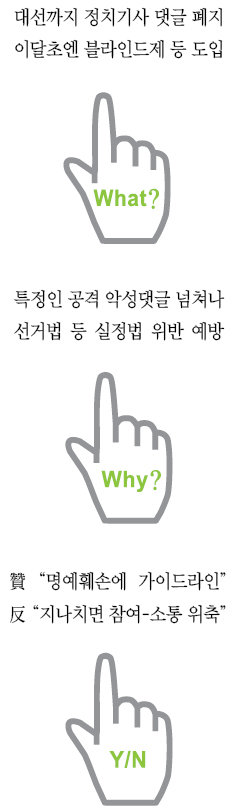
○ 포털 대 누리꾼, 댓글 전쟁?
그러자 뉴스를 본 뒤 당장 댓글을 다는 데 익숙해진 누리꾼들이 네이버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포털이 누구 때문에 컸나’, ‘기사에 대해 비판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등 비난이 이어졌다. 누리꾼 김태환(33·회사원) 씨는 “정보통신부가 6월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용자에 대한 사전 본인 확인 절차)를 실시하는 등 갈수록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데 포털까지 이러는 것은 가혹하다. 댓글 달기는 엄연히 공공재”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댓글 서비스 개편을 이유로 전체 뉴스 댓글난을 폐지했던 8, 9일, 일부 누리꾼은 “댓글을 못 달아 미치겠다”며 관련 기사를 댓글을 달 수 있는 게시판에 퍼다 나른 후 그 밑에 댓글을 붙여 토론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에 네이버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상 댓글을 자유롭게 쓰도록 놔둬야 상업적으로 유리하다. 인터넷 조사기관 코리아클릭에 의뢰해 네이버 정치기사 댓글난이 일원화된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5주간의 정치 기사 조회수를 비교해본 결과 정치 뉴스 조회수가 약 14% 하락했다.
그럼에도 포털이 댓글 제도에 변화를 꾀하는 것은 악성 댓글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 6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했던 한 여고생은 출연 후 누리꾼의 악성 댓글로 자살했다. 탤런트 고소영, 김태희 등은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누리꾼들을 고소했으며 5월 법원은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댓글로 특정인의 신상정보, 비방 등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댓글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대선 후보를 인신공격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며 각종 명예훼손 등으로 일부 누리꾼이 입건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준수의 문제”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의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댓글 개편을 강행하는 분위기는 다른 포털 사이트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다음도 사용자들이 댓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하반기 댓글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리꾼에 대한 걱정이나 댓글문화 정화보다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포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포털 측이 대선 이후 각종 변동에 대비해 몸 낮추기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2일 열린 문화관광위의 언론중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댓글 문제가 논란이 됐다.
○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본질적 고민 필요
댓글에 대한 ‘자율’ 혹은 ‘통제’가 인터넷 미디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달 초 정통부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한 이후 악성 댓글이 15.8%에서 13.9%로 감소했다고 밝히자 조사의 대상이 됐던 일부 사이트 측은 제도 시행 후 전체 댓글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됐다. 통제가 자율적 참여를 줄였다는 것.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재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댓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잘못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것은 공론이 아니다. 진작 원칙을 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누리꾼들이 소중한 장치를 함부로 사용해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아쉽다”며 “하지만 포털 사이트의 통제가 강화될 경우 참여와 소통이라는 인터넷 본래의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태들을 단순히 찬반으로 나누기보다 미디어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통제를 거시적 시각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의 경우 90%가 욕일 정도로 극단적인데 이는 댓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담론, 토론 문화의 문제”라며 “자율 대 통제라는 이분법적 발상보다는 뉴미디어 철학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 “주거비 부담 제일 힘들어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장내시경 검사 받은 60대, 회복실에서 심정지 사망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