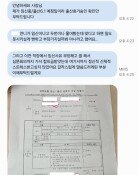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대신 ‘저녁 굶는 삶’ 안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대신 ‘저녁 굶는 삶’ 안 되도록
Posted June. 18, 2018 07:46
Updated June. 18, 2018 07:46
경기 고양시 버스회사 명성운수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100명 가까운 기사가 사표를 냈다.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실질 수입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월급이 줄기 전 퇴직금이라도 받고나가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는 기사도 있다. 기사 월급은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구조다.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기존 추가근무가 기본근무로 집계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월급이 더 준다.
노선버스 뿐 아니다. 음식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근로자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의 회식이 줄어든 여파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사업주가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일도 잦다. 실제로 종사자 5∼9명인 소규모 음식점의 임시 근로자가 받는 시급은 지난해보다 8.6% 올랐지만 월 임금총액은 5.9% 줄었다.
산업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강행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겼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겠다고 선뜻 나설 리 없다. 일자리는 늘지 않은 채 근로자의 실질 임금만 줄어들게 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근로자 12%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수당 의존도가 높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크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 현장과의 교감 없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역설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무능하고 한심하다.